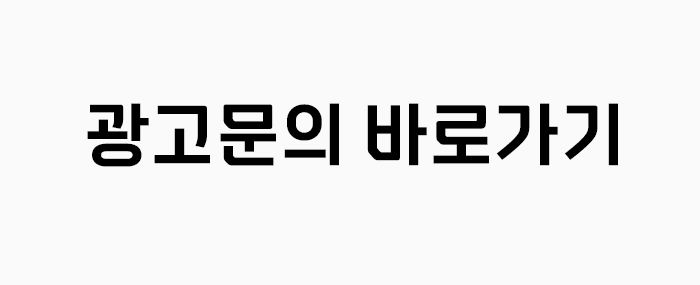확증 편향과 과잉 확신
작성자 정보
- 코리안라이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83 조회
- 목록
본문
우리 나라 대통령이 이재명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 본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53% 그리고 이재명은 37.96% 였고,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64.72%이고 김문수가 22.% 의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 수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심리학 이야기를 한 번 해보자.
연구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은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확증 편향을 아주 강하게 보인다. 확증 편향은 자기가 검증하려는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정보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탐색할 때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 위주로 정보를 탐색하고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리고 정보를 해석할 때는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위의 선거결과를 보고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보수들이 사전 투표를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내란을 종결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그렇게 높아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석을 한다. 위에 나온 결과를 보고 자신이 지지하는 가설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라고 의혹을 제시하는 것을 선거에 진 사람들이 하는 코스프레라고 해석을 한다. 이런 해석들을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고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예를 들어, 실험에서 2, 4, 6 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여주고 이 세 숫자에 있는 배열 규칙을 찾아 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2‘ 만큼 증가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에게 생성 규칙에 맞는 예를 만들어 내라고 해서 가설을 검증하도록 하면 대부분이 2, 4, 6 과 비슷한 12, 14, 16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규칙을 확증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규칙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실험을 만든 사람이 당신의 실험 규칙이 틀렸다라고 하면 좌절하면서 답을 잘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에 맞는 예를 찾아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확증 사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쉽게 들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 하려 한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규칙이 틀렸을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지 않는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규칙이 옳은 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것을 반증 사례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위의 실험에서 자신이 만든 예를 통해 규칙을 찾아가게 해서 답을 찾는데 시간이 한참이나 걸린다. 이 실험의 규칙은 ‘첫번째 숫자보다 두 번째 숫자가 크고 두 번째 숫자보다 세 번째 숫자가 크다’는 단순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확증 편향은 ‘과잉 확신’과 이어진다. 심리학에서 과잉 확신의 개념은 사람이 자신의 결정이나 판단의 정확도를 실제보다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확증 편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증거를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과잉확신의 개념은 오래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에게도 보인다고 한다.
전문인인지 아닌 지와 상관없이 세대별로 정치적인 성향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지를 보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재 점검해 보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자연스럽게 찾고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으로 과잉확신이 더 강해지지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확증 편향이나 과잉 확신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세대들과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새로운 정보나 객관적인 사고를 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몇 일전 생명의 전화로 전화를 하신 분은 연세가 많으셨는 데 자녀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고 아주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셨다. 그런데 왜 그 분은 자녀와의 소통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새로운 사고에 열려 있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들로 자신의 생각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확증 편향’이나 ‘과잉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피드백을 받는 것은 과잉 확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너무나 강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말이다. 그래서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그렇게 서로가 싸우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1)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각각의 이유의 설득력 정도를 적게하는 조건과 2)자기의 생각과 반대편 생각 각각에 대해 지지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각 이유의 설득력 정도를 적게 하는 조건 그리고 3) 통제 조건의 세 조건을 실시해서 과잉 확신을 보이는 정도를 비교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험결과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두 번째 경우에만 과잉확신을 적게 보였다고 한다. 해석하기는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다 보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의 틀린 부분을 경험하게 되어 과잉확신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한다.
위의 연구에서 소위 꼰대 소리를 듣는 40대 이후의 나이가 든 사람들이 더 가지기 쉬운 확증 편향과 과잉 확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상대 입장에 처한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찾아보고 반대쪽을 지지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와 설득력 정도를 적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을 시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보수나 진보나 편향된 오류로 나아가진 않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통계학에서는 표본이 큰 경우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한다.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진보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큰 표본에서는 10% 이상 편차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도경수가 쓴 ‘사고’라는 책에서는 사람들이 추리, 판단,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생각보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바른 사고를 위해 사고 대상에 대한 지식의 양을 늘려야 하고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그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냐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나의 사고를 점검하는 ‘메타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을 좀 더 들이더라도 평소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 때 자기가 생각한 것 외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줄 알고 오류에서 벗어나는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정보와 조사를 통해 나의 가설을 점검해 보는 용기가 맹목적인 확증 편향과 과잉 확신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호주기독교대학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