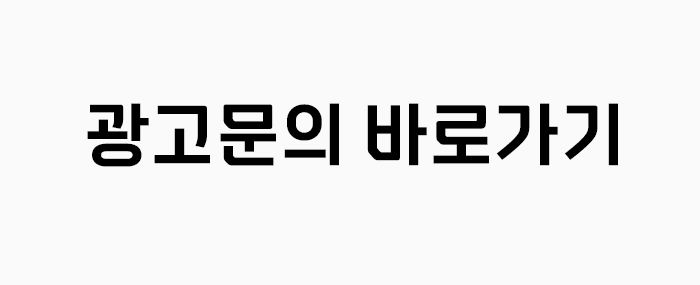현실 감각 되찾기
작성자 정보
- 코리안라이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91 조회
- 목록
본문
가끔 살다 정신줄을 놓고 멍한 상태가 될 때가 있다. 대부분 충격을 경험했을 때다. 한 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후 그 분은 자신의 아픔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한다. 증세는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삶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많아지고 그 불안은 우울감과 함께 큰 무력감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씩 멍한 상태가 되고 집중이 되지 않는 일이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한 분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 트라우마 치료인 EMDR을 통해 트라우마를 다루기로 했다. 치료를 위해 그 다음 시간에 그 분을 만났는 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표정이 멍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잠이 온다고 하면서 하품을 하고 상담에 도저히 집중이 안된다고 말했는데 마치 뭔가가 이 사람의 혼을 빼 놓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트라우마의 거장 베셀 반 데어 콜크는 그의 책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은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는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사례들을 설명한다. 그 중에 이렌이라는 아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아무 것도 없는 침대를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응시하고 바라보는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큰 충격으로 인해 분리되고 동떨어진 기억들을 전문가들을 ‘해리’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멍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음 근력 키우기로 유명한 김주한 박사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정을 ‘두려움’으로 보고 두려움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두려움을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고 설명하는 그의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통해 위의 예 들에서 보인 멍한 상태를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큰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인간의 몸은 크게 반응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모습이다.
그 세 가지는 “싸우기, 도망가기, 얼어붙기”다. 큰 두려움이 왔을 때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에도 더 큰 힘을 내어 두려움의 대상과 싸우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신이 그 두려움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고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 도망을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큰 두려움에 압도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얼어붙게 되면, 신체는 모든 기능을 정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어 해리 상태가 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기도 한다.
위에 나오는 예 들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는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 즉, 교통사고와 어린 시절의 학대, 상실로 인해서 몸이 충격 상태에 빠져 기능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셔터를 내린 것 같은 증세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멍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마치 몸을 떠나버린 것과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신 줄을 놓고 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감을 되찾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현실감을 되찾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법을 영어로는 그라운딩 기법 (Grounding)이라고 한다. 다양한 그라운딩 기법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의 발이 땅을 딛고 있는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내 발가락에 어디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 발가락 하나 하나는 편안한 지, 내 발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는 지, 나의 발이 신고 있는 신발의 느낌은 어떠한 지, 그 신발이 발에 닿은 느낌은 어떠한 지를 느껴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처럼 발을 이용해서 걷고 다니지만 그 발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다. 그 감각을 느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기법은 확대하여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으로 활용되어질 수도 있다.
약간 다른 기법으로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지금 이 곳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의 이름을 불러 보는 것도 현실감을 되찾는 기법이 될 수 있다. 또 바깥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두번째로 현실감을 되찾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법 중 하나는 글쓰기다. 두려움에 압도된 뇌의 반응이 가져다 주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는 트라우마가 주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에, 글쓰기를 통해 전두엽을 활성화 시키면 멍한 상태의 증세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통의 상황에 압도되어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유연한 생각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최근 ' 폭싹 속앗수다' 라는 인기 있었던 드라마를 가족들과 함께 본 후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당신도 시를 써보지 그래?’ 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날, 아침 일련의 힘든 사건을 경험한 후 그것을 시로 표현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시를 쓰기 전과 쓴 후의 나의 감정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을 통해 글쓰기와 치유와의 관계를 새삼 느끼게 되었고 글을 쓴 후, 나는 더 이상의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 멍, 불 멍’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뇌를 잠시 풀 가동하지 않고 쉬게 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트라우마의 공포가 남긴 멍한 상태는 충격이 가시지 않은, 아직은 공포의 충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현실에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돌봄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것이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때로는 치료사가, 그들이 현실 감각을 되찾도록 함께 도와야 할 것이다.
호주기독교대학 서미진 박사